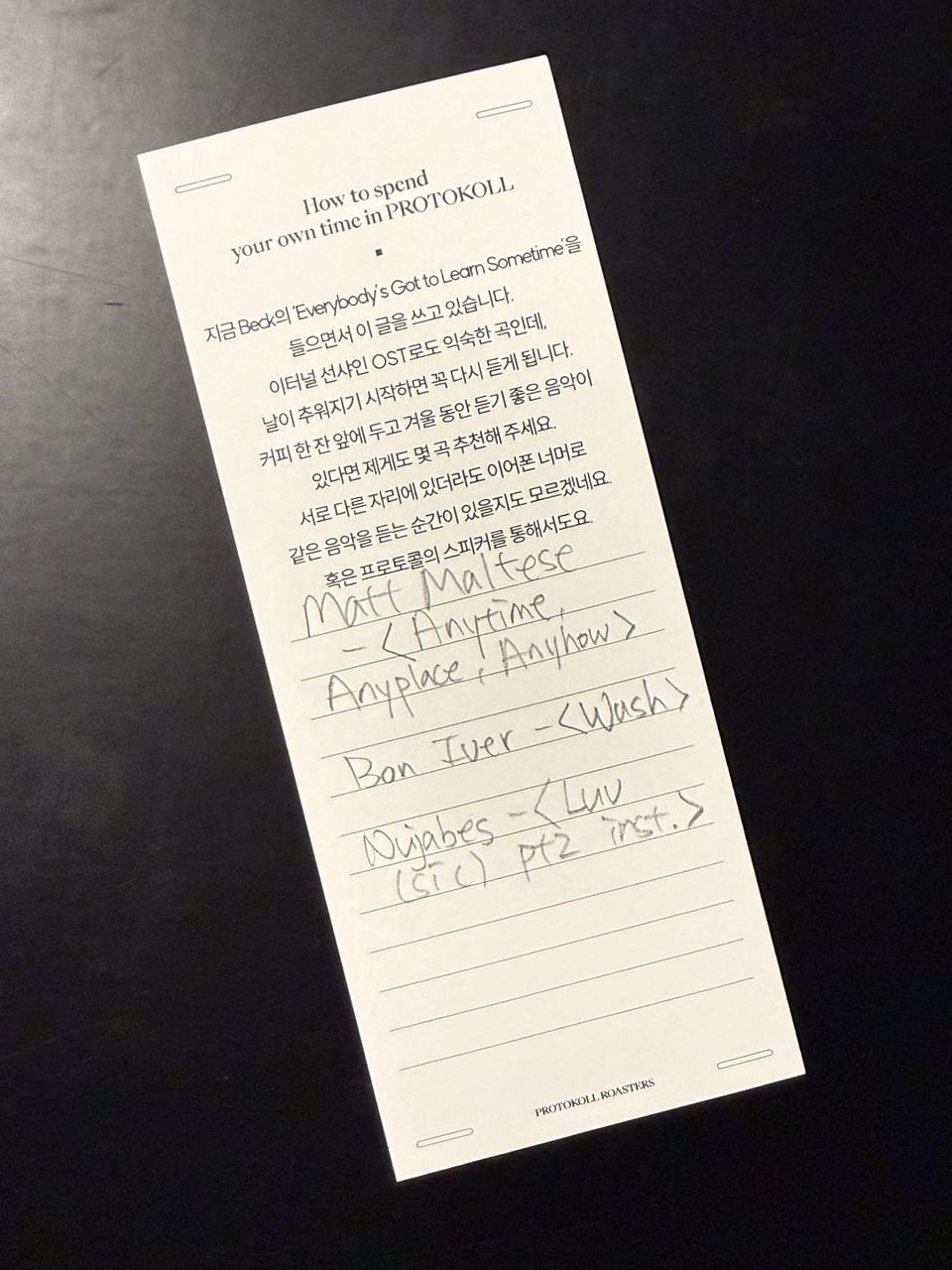<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알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랑과 청춘. 어쩌면 동의어인.

사실 영화를 굉장히 편하게 보고 나와서, 해석이나 해설 등을 담은 감상평을 남기기가 꺼려졌다. 그래도 소감을 남기고 싶은 훌륭한 영화라 이렇게 적는다.
영화의 원제를 곧이곧대로 번역하자면, "지상 최악의 사람" 정도가 된다. 레나테 레인스베가 분한 주인공 '율리에'가 바로 그 인물일 텐데, 최악까지는 아니겠으나, 꽤나 예민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라는 걸 영화 초반에서부터 쉬이 알 수 있다.
율리에는 약동하는 인물이다. 30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춘으로까지 분류되지는 않는 나이지만, 20대와 30대의 경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다. 그녀는 페미니스트이며, 아이를 원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한껏 사랑하는 사람이다. 조금은 이입하기 어려울지 모르는 이 인물에 관객이 동화되도록 만드는 건 레나테 레인스베의 훌륭한 연기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표정, 억지웃음, 감정의 변화, 불안과 초조, 마약에 취하고, 이따금씩의 멋쩍음까지. 인물의 클로즈업이 많은 이 영화에서 이런 표정을 가진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는 건 축복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오히려 감독은 이야기 진행의 중심이 되는 율리에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감독의 견해가 투영된 건 앤더스 다니엘슨 라이가 분한 '악셀'이라고 생각한다. 악셀은 영화 후반, 자신의 만화가 여성을 희화화한다는 페미니스트의 비판에, "예술은 원래 더럽고 추저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가 얼마나 직설적이고 음란한지 생각해 보면, 관객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 챕터만 특히 짧다는 걸 고려한다면 더욱이.
그러나 악셀은 구시대적이고, 꼰대스러운 면모를 갖고 있다. 아이를 바라기도 하고, 율리에에게 넌 아직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율리에를 사랑하고 응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악셀은, 거칠지만 속칭 '불편함'이 없었던 과거의 상징이며,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러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율리에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감독의 태도는 촬영에서도 드러나는데, 영화의 중요한 부분, 특히 영화의 엔딩에서 아웃포커싱이 활용되는 것이 그러하다. 카메라는 율리에보다 율리에를 둘러싼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이 보인다.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율리에가 결국 아이를 갖게 되어 악셀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 등. 특히 임신 이야기를 들은 악셀의 벽안은, 정말 잊기 힘들다.
결국 이 영화는 그렇게, 약동하는 청춘이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는, 때로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거의 완벽하게 담아낸다. 음악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훌륭한 음악의 활용을 보여주는데,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라라랜드>와 <비포> 시리즈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페미니즘과 환경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부분에서는 <포레스트 검프> 같은 느낌도.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고 난 후 사랑이란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했다. 쉽지만 어려운 것. 그것이야말로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 아닐까.
이 글이 좋았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작은 격려가 다음 글을 쓰는 이유가 되어 줍니다.
후원은 블로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