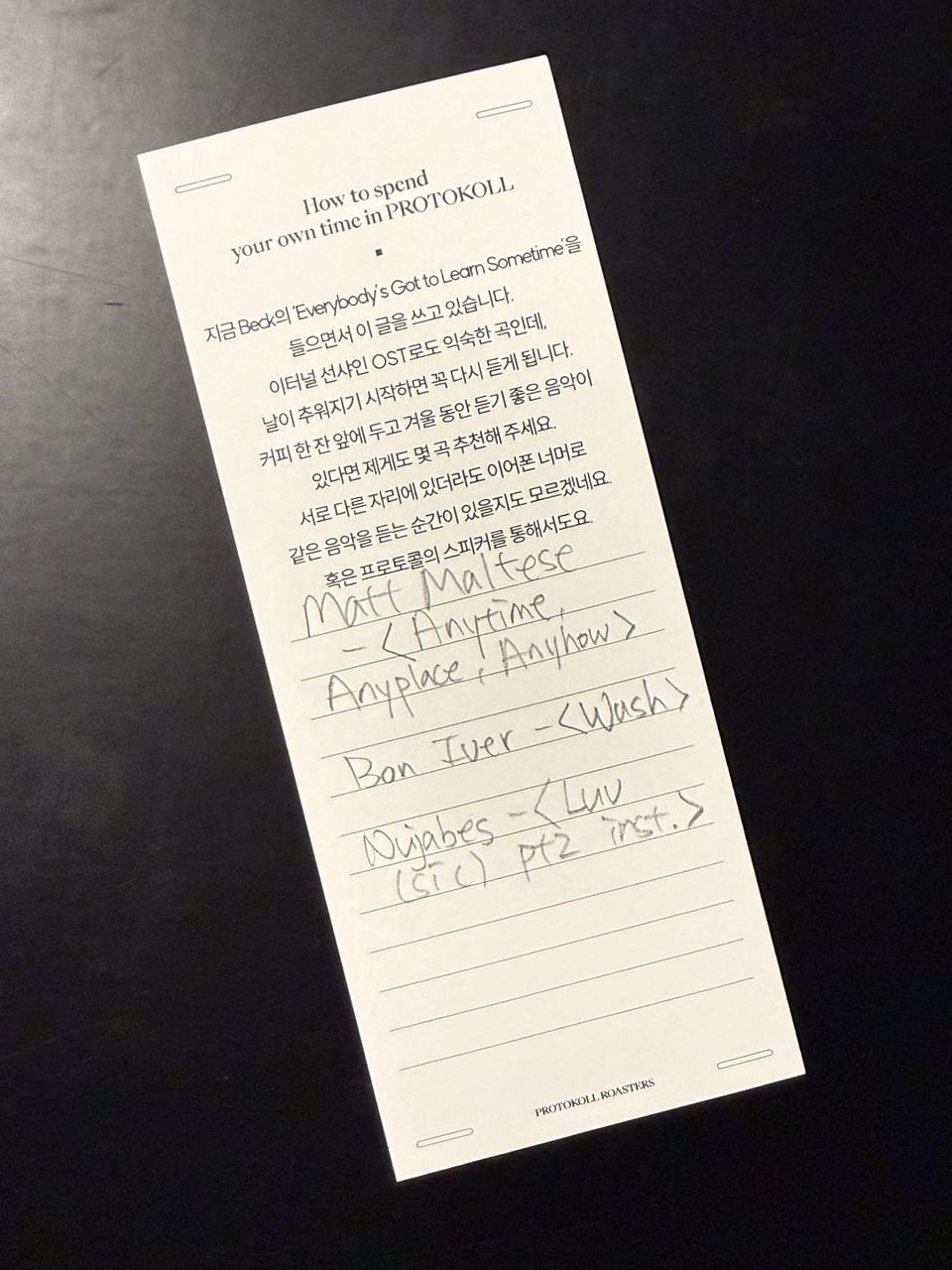<더 퍼스트 슬램덩크>
생동하는 장면으로 소생된 박제된 추억.

평가가 무의미한 영화들이 있다. 유년의 강렬한 추억이 담긴 영화(<트랜스포머>), 어떤 한 세월을 대표하는 영화(<어벤져스: 엔드게임>), 특정 시퀀스가 너무 훌륭한 영화(<베이비 드라이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영화(<싱 스트리트>) 등, 영화의 완성도나 평론가들의 평가와는 별개로 그냥 내 마음속에 깊게 남는 영화들 말이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그런 영화 중 하나다. <슬램덩크> 세대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슬램덩크>를 3~4회 정도는 완독했다. 원체 만화를 빠르게, 앞에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읽는 나임에도 인물들의 서사 하나하나를 읊을 수 있을 만큼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만큼 이 영화에서 그때 그 만화 속 명장면들이 눈앞에 나타날 때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작화. 영화란 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 나는 '여러 장의 사진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그 위에 사운드를 덮어 하나의 완결된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장르'라고 말하곤 한다. 그 사진 하나하나의 아름다움, 이 경우 그림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이 영화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이노우에의, 그리고 이노우에가 감독한 그림 하나하나는 신체를 아주 멋들어지게, 또 현실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더 나아가 그림들의 연결도 기가 막히다. 특히 마지막에 송태섭이 더블팀을 뚫을 때의 연출은,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연출이었다고 본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줄 수 있는 장면적 쾌감을 잘 활용한다. 두 번째는 사운드다.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능동적인 사운드의 활용보다 수동적인 사운드, 곧 적막의 활용이 더 두드러지는 영화다. 나는 이 영화가 그 적막 속에 숨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관객과 화면 사이의 일종의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해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의 흐름의 구현이다. 나는 평상시에도 농구를 즐겨보는데,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대강 90분 내외의 경기 시간을 가진 축구와 다르게, 농구는 0.1초까지도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만큼이나 48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승부를 겨루는 것이 중요한 스포츠. 만화에서는 샷클락 컷으로 보임으로써 분절적으로 표현되어버린 그 시간의 흐름이, 영화라는 매체에 녹아들어 온전히 표현되면서 농구라는 스포츠의 특징이 오롯이 살아난다.
분명 단점도 많다. 기존 <슬램덩크>의 팬이 아니라면 따라갈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스토리 구성도 그렇고, 송태섭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인물의 서사를 담아내려는 노력도 오히려 산만함으로 이어졌다. 적막의 활용은, 물론 장점에 적기는 했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찔러서 나온 눈물이 눈물이 아니듯이, 강제로 숨죽이게 만든 그 호흡을, 과연 함께한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중간 작화의 붕괴도 조금 거슬렸다.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아마추어 농구 룰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정우성의 마지막 득점 이후 샷클락이 가고 있는 것도.... 몰입이 조금 깨졌다.
그래도 이러한 단점보다 상기한 장점이 더 크고, 단순히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데에서만 그치지는 않는 작품이다. 굳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빙판으로도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 글이 좋았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작은 격려가 다음 글을 쓰는 이유가 되어 줍니다.
후원은 블로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