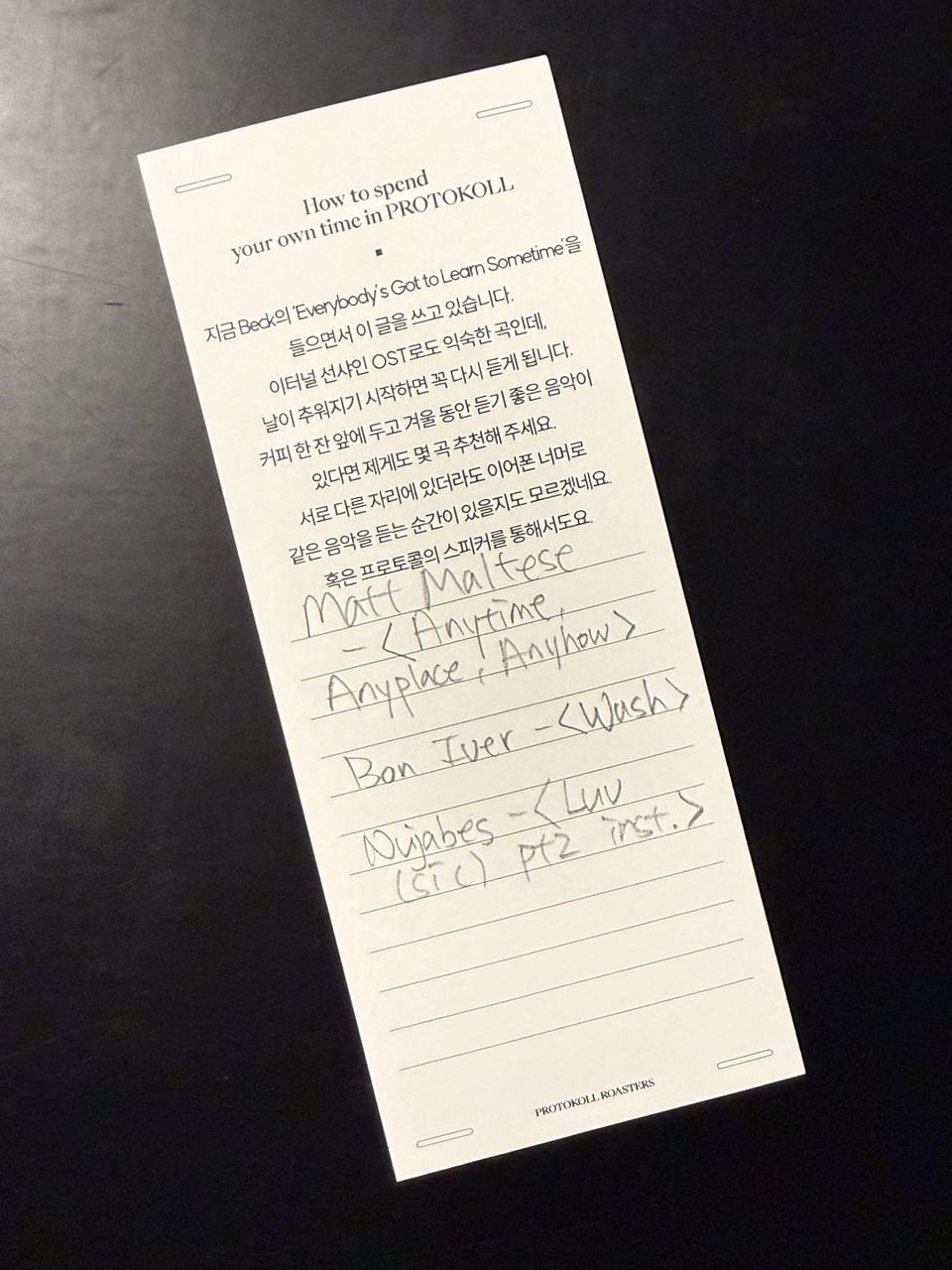<가장 보통의 존재>와 <mono>
앨범을 듣는다는 것. 콘텐츠의 길이도, 집중의 시간도, 만남의 지속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짧아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행위가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관해서.

전부터 앨범 하나를 듣는다는 것에 관한 글을 쓰고 싶었다. 콘텐츠의 길이도, 집중의 시간도, 만남의 지속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짧아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행위가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관해서.
싱글이 아닌 이상에야 하나의 앨범은 적어도 20분, 평균적으로 40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진다. 이 시간 동안 온전히 음악을 듣는 데에 시간을 할애해야만 '앨범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앨범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생 버튼을 눌러놓는 게 아니라, 왜 그 순서로 곡이 배치되어 있는지, 곡과 곡 사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종국에 이 앨범 전체가 담아내고 있는 서사가 무엇인지 곱씹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취자가 앨범을 듣도록 창작자 역시 노력해야 한다. 앨범 내의 곡 자체도 좋아야 할뿐더러, 그 앨범의 색채가 명확해야 하고, 앨범 내 곡의 배치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음악을 재생시켜놓은 채 그저 듣는 것이 앨범을 듣는 것이 아니듯, 단순히 곡을 모아둔 모음집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앨범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최고로 꼽는 두 앨범은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와 장기하와 얼굴들의 <mono>다. 두 앨범 모두 밴드의, 존재에 관한, 5집 앨범이라는 점이 참 묘하다.
<가장 보통의 존재>의 경우, 어떤 존재가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지극히 보통의 존재임을 인식한 뒤, 그럼에도 앞으로 걸어나가며 누군가의 별이 되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서사는 작사와 작곡을 담당한 이석원의 깨달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이 앨범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류의 사상이 발전해 온 흐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우리의 실존과 본질에 관한 위협이 음악으로 세련되게 녹아들어졌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석원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닐 거라고 사료되지만 말이다.
사상사의 3대 전회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꼽힌다. 최초의 전회 이전, 인류는 신이 자신을 창조했으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지닌 채 살아왔다. 마치 영아기의 아이처럼.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인류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천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다윈은 더 나아가 인간은 창조의 산물이 아닌 진화의 산물이며, 원숭이의 후예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그 원숭이의 후예인 인간이 성적 충동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된다며 마지막 남은 존재의 존엄성마저 크게 깎아내린다.
가장 보통의 존재임을 알아가는 것. 곧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인류가 영아에서 어른으로 커가는 것. 그 내용이 담겨 있어 이 앨범을 사랑한다.
한편, <mono>는 외로움에 관해 얘기한다. 'mono'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의, 단일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녹음 방식부터 앨범의 서사까지 지극한 통일성을 띠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가장 보통의 존재>와는 다르게, <mono>의 곡들은 제각기 다른 화자를 갖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나, 살아가는 것도 나, 그렇게 나 홀로, 삶은 결국 혼자'라는 생각이 앨범을 관통하며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 쓸쓸함을 경쾌한 음악으로, 적절한 묘사로 담아낸 게 이 앨범의 매력이다. 등산은 왜 하는 걸까 생각하다가, 결국 내가 지금 혼자라 느끼는 건 애초에 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누가 다시 내게 와준다면 역시나 반가워할 테지만, 어느 순간엔 또 다시 나 혼자 걸어가고 있을 거라는, 너를 떠나보낸 걸 언젠가 후회할 거라는, 사실 벌써 그렇다는, 그러며 자신에게 아무도 필요 없다고 되뇐다는.
이 두 앨범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도 나만큼 외롭구나, 또 나와 같은 우울을 갖고 있구나 느낄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아주 신나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동기화, 즉 공명을 만들어내는 음악. 언제 들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앨범들이다.
이 글이 좋았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작은 격려가 다음 글을 쓰는 이유가 되어 줍니다.
후원은 블로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