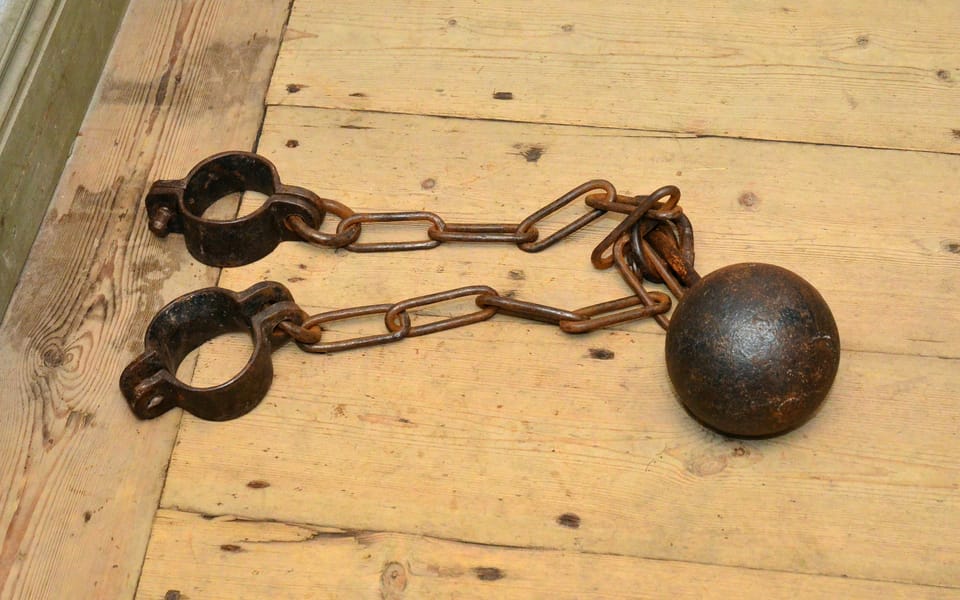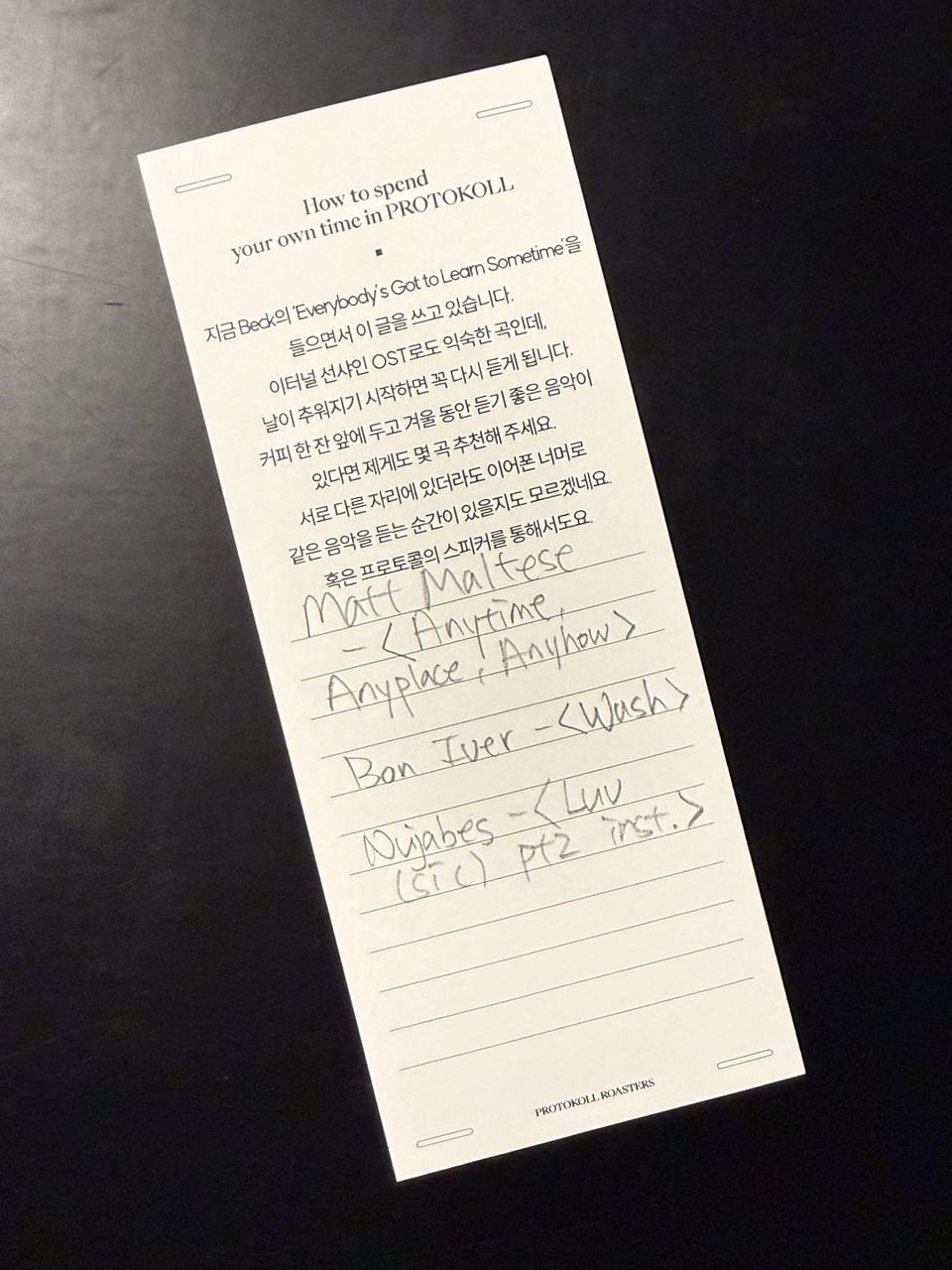<한산: 용의 출현>
기다림의 미학.

<한산: 용의 출현>은 아주 영악한 영화다. 감독은 자신에게 주어진 외재적 환경을 최대한으로 살려,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캐릭터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체에 맞게, 또 명료하게 전달한다. 조금은 촌스럽지만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 중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다. 적어도 이순신을 모르는 채로 이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스토리를 어떻게 그려내도 관객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소리. 게다가 이 영화가 1,700만 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 <명량>의 후속작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결국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영웅적인 승리를 그려냄에 있어 영화라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일 것이다.
영화 속 이순신은 기다림의 인물이다. 심지어 그의 언사는 기다림을 넘어 삼감에 이른다. 언행에 있어 그가 변화를 보이거나 활달해지는 건 오로지 그를 통해 승리를 얻어낼 수 있고, 또 얻어내야만 할 때뿐이다. 그 신중함은 적잖은 울림을 주는데, 이는 그러한 신중함 속에 과감함이 놓여있고, 그 과감함이 압도적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중동 그 자체, 기다림의 미학.
올해 박해일의 연기력에 거듭 놀라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정중동, 기다림, 신중함, 삼감 등으로 대변되는 그 인물을 연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 절대 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박해일은 그 어려운 걸 그토록 잘 해낸다.
영화 자체도 자신이 담아내고 있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처럼, 진득하다. 조금은 지루할 정도로. 그러나 카타르시스를 끌어올리는 거북선의 등장, 흐름의 최고점마다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 이순신, 그 진득함을 담아내고 있는 듯한 바다와 조류의 정경까지, 나름 이유가 있고 또 해소가 되는 지루함이라는 점에서 그리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아쉬운 부분은 역시 한국 영화의 고질적 문제인 메시지의 전달. 특히 "의와 불의의 전쟁"이 보이스 오버로 플래시 백 될 때는 정말, 흥이 다 깨져버렸다. 게다가 적장 협판안치를 잔악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입체적인 인물로 잘 그려내지 않았는가. 대관절 이 영화 속의 임진전쟁이 왜 의와 불의의 전쟁인지 아직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액션씬이다. 훌륭했다. CG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Seamless 했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렇진 못했다. 그래도 타격감과 쾌감을 충분히 주었고, 어색하지 않게 녹아들어 관람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킬링타임으로도 좋은 영화.
전체적으로 괜찮은 영화였다. 또 보라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OTT에 풀리면 마지막 전투씬은 한 번 정도 볼 것 같기도 하다.
이 글이 좋았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작은 격려가 다음 글을 쓰는 이유가 되어 줍니다.
후원은 블로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