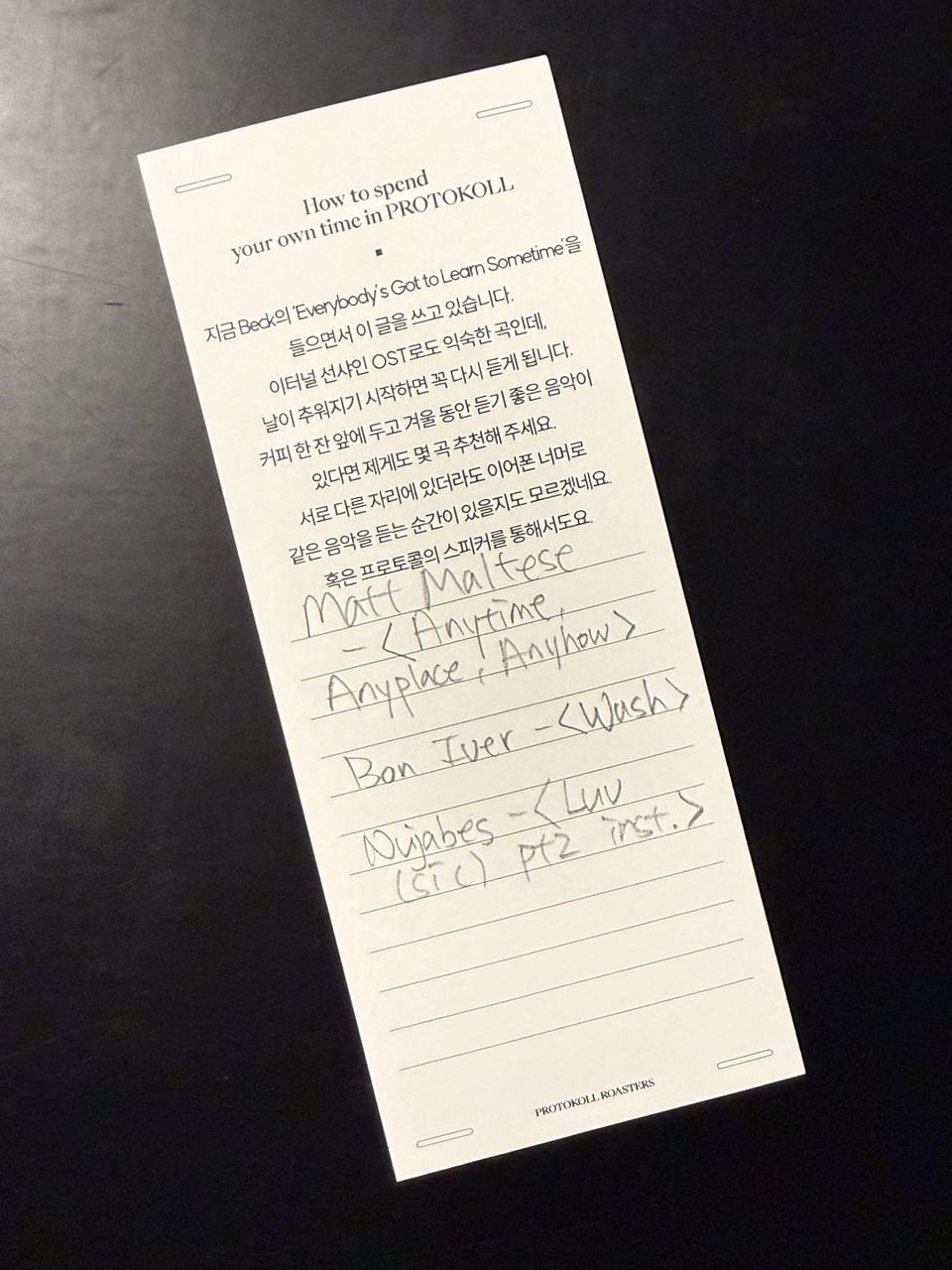굿바이 관악!
정든 관악을 떠나는 날.

이제 곧 다른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될 나의 방에는 내가 누울 자리가 없다. 열 개 남짓한 박스 사이로 팔과 다리를 낑기기보다는, 차라리 밖에서 설레는 이별을 준비한다.
처음 기숙사에 입주하던 날이 생각난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덥수룩한 머리, 엉덩이를 슬쩍 가리는 짧동한 코트를 입은 20살 촌놈이었던 때. 짐을 옮기고, 지문을 등록하고, 낙성대 엉터리 생고기에서 고기를 먹은 뒤, 가족을 보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그 기분은 20살의 나를 지배했다.
고시촌에서 살던 때도 있었다.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던 곳. 창 뒤에는 중학교가 있었고, 때때로 산뜻한 바람에 실려온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나를 깨우곤 했다. 침잠하던 나. 약동하던 나. 오히려 지금의 나보다 더 어른스러웠던.
군 생활을 마치며 들어갔던 20년 된 오피스텔. 방충망에 구멍이 있어 여름에는 모기와 함께 살았고, 몇 층인지 모를 아랫집의 담배 냄새가 그 구멍 사이로 들어오기도 했다. 몇 번을 고쳐도 계속 고장이 나는 세탁기와 함께 살기도, 그래서 공실에 있는 세탁기를 쓰기도. 그래도 2년여 만에 찾아온 자유를 만끽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 이후 지금의 집으로 옮겼다. 두 시간 뒤면 나의 흔적만 남게 될 바로 그. 비좁은 방은 세 명 이상을 들이기 어려울 정도였고, 가끔씩 들어오는 볕에도 감사를 표해야 했다. 밤에는 서울대입구역의 유명한 술집에서 들려오는 청춘의 소음을 외면하며 눈을 붙여야 했고, 또 그들이 끝도 없이 피우던 담배 냄새를 들이마셔야 했다.
영원한 떠남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감상적이 되는 건, 아마도 그만큼 내가 이 공간에 애착을 느끼기 때문일 테다. 나의 청춘이 담겨있는 이 동네를. 행복에 겨워, 우울에 지쳐, 압박에 쫓겨, 또는 흥분을 머금은 채로 맞이했던 그 숱한 밤들을 보낸 관악을. 이제는 관악이 나를 보낸다. 20대의 초중반이 나를 내일로 떠민다.
이 글이 좋았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작은 격려가 다음 글을 쓰는 이유가 되어 줍니다.
후원은 블로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