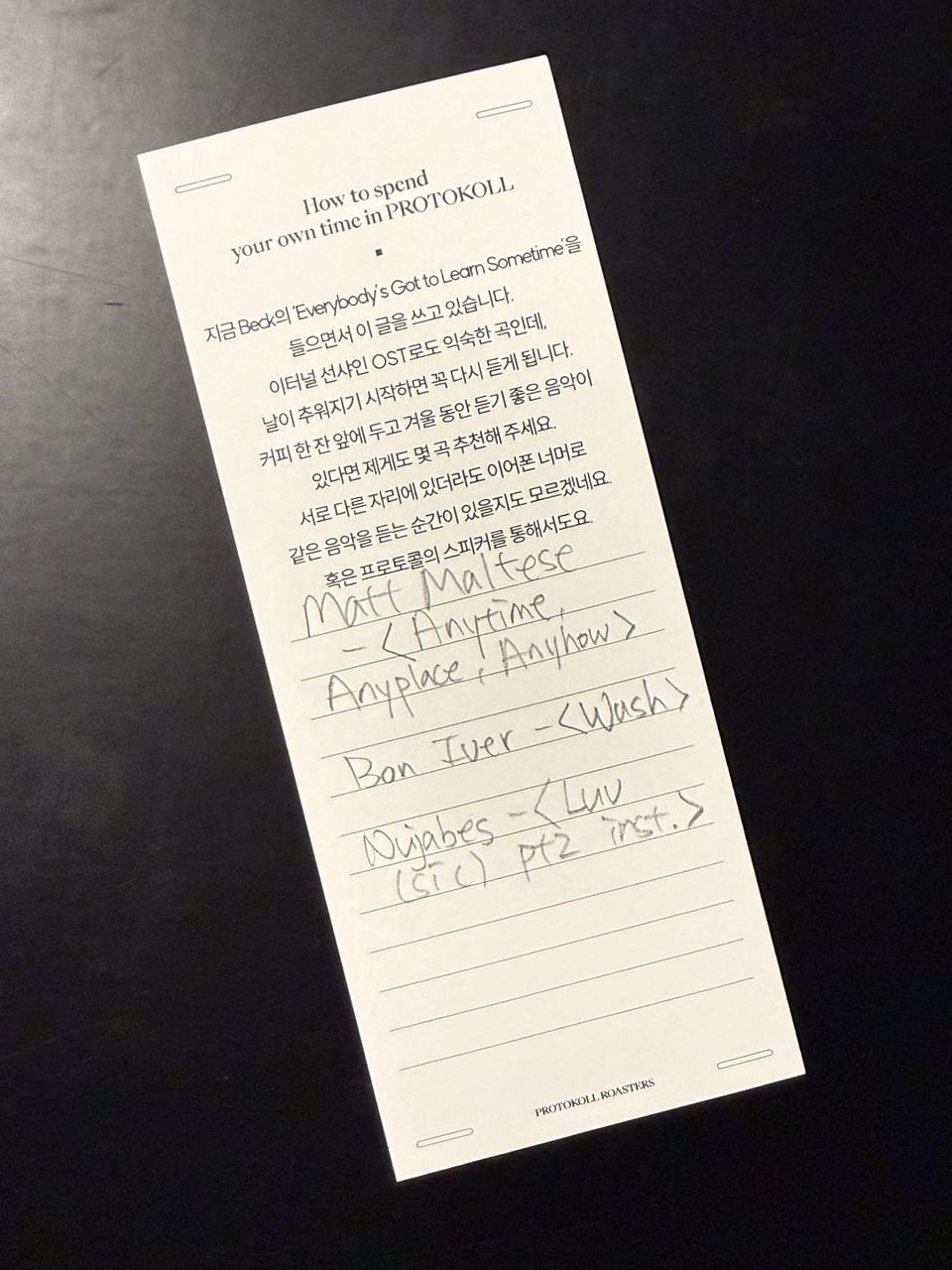<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
예술은 "우리를 더 깊이 존재하게 한다." 예술은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도록 촉구한다.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책을 만나, 책의 4부를 아직 다 읽지 못한 채로 서둘러 서평을 남긴다.
대학 생활의 뒷 절반은 주전공인 경제학보다 복수전공인 미학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 선호는 여전하다.
굳이 따지자면 삶도 경제학보다는 미학에 좀 더 가깝게 그려 나가는 것 같다. 열심히 재고 따지다가도 결국 (미적) 직관이 나를 이끄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는 한다. 여러모로 그림이 좋으니까,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있기에 얼렁뚱땅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좋은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좋은 예술 작품을 미술관이나 갤러리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가?"
물론 학계도 쉽게 풀지 못하는 이 난제들에 기껏해야 학사인 내가 어찌 좋은 답을 내놓겠냐마는, 그럼에도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는 했다.
미묘하게 불편한 이 감정은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며 나를 괴롭혔다. 자신만만한 내 앞에 불쑥 나타나 겸손함을 요구했고 이내 내가 의기소침해지면 배움과 성장을 촉구했다.
그러다 이 책을 접했다. 멋대로 의역하자면 "심미안을 갖고 싶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뉴욕 미술계에 몇 년 동안 직접 몸담으며 경험하고 느낀 바를 풀어낸 비앙카 보스커의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 주저하지 않고 읽기 시작했고, 깊이 빠져 책장을 넘겨댔다.
내가 몇 시간 전에 읽고 있던 이 책의 3부 끄트머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다. 동네방네 이 책을 읽어보라고 소문내고 싶었다.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웠다.
시각이 여러 감각 중 으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적을 것이다. 최소한 예술과 이를 다룬 학문은 예로부터 시각을 가장 믿을 만한 감각으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각 체계는 늘 현실을 멋대로 창조한다." 우리는 우리의 뇌가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본다. 당연하다. 시각 역시 진화의 산물이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은 '완벽한' 파악이 아닌 '빠른' 파악일 테니 말이다.
책에는 흰 셔츠의 예시가 나온다. 흰 셔츠가 반사하는 빛의 파장은 슈퍼마켓 조명 밑에서와 새벽녘 어스름 밑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슈퍼마켓을 나설 때의 우린 색의 변화에 잘 주목하지 않는다. 누군가 셔츠의 색을 묻는다면 여전히 흰색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예술가는 뇌가 예측하고 창조한 환시가 아니라 이른바 '현실'을 그려낸다. 모네가 루앙 대성당을 매번 다른 색으로 그려냈듯 말이다. 더 나아가 현대의 예술가들은 아예 뇌가 예측할 수 없는 이미지로 그 관성을 방해한다.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시각 및 시각 이미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쇤베르크의 음악을 떠올려 보자.
하여튼 이로써 예술은 "우리를 더 깊이 존재하게 한다." 예술은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도록 촉구한다.
"세계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은 우리에게 그건 허상임을 일깨운다."
"예술은 우리의 본능이 현실에서 줄기를 쳐내고 가지를 생략하려 드는 시도를 막는 수단이고, ... 더 많은 것을 알아채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에 공감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삶이 각자가 수집한 경험의 총합이라면, 예술은 그 경험을 압축하지 않음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가 같은 시간에 더 큰 삶을 살게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이 질문을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삼분하여 접근한다. 칸트에게 있어 인간이란 진, 선, 미의 종합체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선해지도록 교육받으며 자란다. 하지만 더 깊은 심미안을 갖추도록, 내면과 바깥 세계의 미추를 느끼며 감성적 희망을 고찰하도록 교육받지는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진과 선의 추구에 비해 미의 추구는 국가의 유지와 성장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기에. 미에 대한 정의 및 좋은 예술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하기에. 실제로 예술 작품이 그 스스로 대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기에.
하지만 여전히 미는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 한 요소다.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분명 필요조건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인격을 도야해야 하듯, 미와 미적인 것을 경험하며 심미안을 깨워 나가야 한다.
한때 팔정도(八正道)의 첫 덕목인 '정견(正見)'이란 단어에 빠져 있었다. 당시의 나는 정견을 "맑은 마음으로 인과의 연쇄를 꿰뚫어 보는 것. 내 마음이 주장하는 인과가 아닌, 진짜 인과를 보는 것"이라 해석했었다.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술은 우리가 정견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다. 예술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내재화한 많은 믿음 너머에 있는 바른 대로의 현실을 보게끔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다."
정의가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하지만 내면에서 충분한 만족감이 우러나온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자문하게 된다. 최근 에드워드 리의 <버터밀크 그래피티>를 읽으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다.
10년 후에 두 책에 담긴 이야기의 한 대목이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 99% 확률로 아닐 것 같다. 그렇다면 기억되지 않을 이 이야기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가 내 세계의 외연을 넓혔다는 다소 뻔한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적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앞으로 벽지에 먼동이 비쳐 그것이 검푸른색일 때, 오롯이 흰색일 때, 석양에 그을려 주황색일 때를 구분하며 살아갈 것이다. 마이애미에 가야 한다면 아트 페어가 열리는 시기와 포갤 것이다. 한편 정통보다는 전통이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하며, 언젠가 모로코에서 스멘(Smen)을 먹어 보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미국에서 이민자의 음식을 접할 때면 그들의 뿌리와 나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결국 이야기는 힘이다. 우리 세계의 가장자리를 좀 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잠시 머물다 가지만, 돌아보면 그로 인해 변화되었던.
이 글이 좋았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작은 격려가 다음 글을 쓰는 이유가 되어 줍니다.
후원은 블로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됩니다.